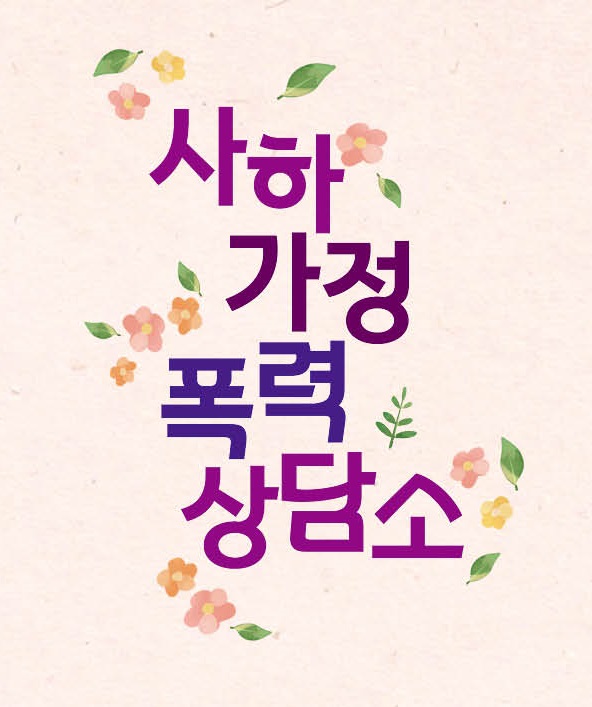|
| |||
"엄마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흘러 내렸어요. 민소매 티셔츠가 붉게 물들 정도였죠. 제가 아빠에게 '엄마 머리에서 피 나잖아'라고 했더니 무섭게 욕을 하며 '빨리 안 꺼져'하고 소리쳤어요. 엄마한테는 일감에 피 묻으면 안되니까 빨리 씻고 오라고만 했고요. 화장실로 들어가는 엄마의 눈에 맺혀있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수지(가명)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긴장하던 첫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복받친 감정을 쏟아냈다. 거친 욕설을 재연하다 이내 한숨을 지었다. 그의 표정과 눈빛, 만지작거리는 손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다. 분노와 공포, 슬픔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한국일보가 25~29일 연재한 '안방의 비명' 기획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만난 수지씨는 25년간의 학대 끝에 아버지를 살해한 어머니의 비극을 1시간 넘도록 풀어놨다. 상담사, 경찰, 변호사에게 열 번, 스무 번 했을 얘기였지만 그의 감정은 무뎌지지 않았다.
나에겐 이렇다 할 폭력의 기억이 없다. 취재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가정폭력은 나와는 상관 없는, 대수롭지 않은 '남의 일'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곧 깨달을 수 있었다. 수지씨의 감정이 전이되면서 숨이 막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빠 없는 지금에서야 엄마와 함께 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수지씨의 말에서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 돼서야 지긋지긋한 공포에서 벗어나 편안해지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국가가, 법과 제도가, 우리 모두가 이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의 학대 상처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어른들,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가해남편에게 확인해서 그냥 돌아가는 경찰, 가정을 지켜야 한다며 가해자를 격리하지도 엄벌하지도 않는 가정폭력특례법이 피해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
이런 식이다. 폭력 남편에게서 도망쳐 아이와 함께 가난하지만 단란한 삶을 살고 있던 여성은 남편에게서 온 전화 한 통 때문에 공포에 휩싸인다. 저소득층에 학용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별 생각 없이 남편에게 연락했다가 아이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준 탓이다. 아버지가 친권자라는 이유지만, 이 때문에 단란했던 가정은 한 순간에 위험에 빠졌다. 취재 과정에서 이런 사례들을 만나면서 부모라는 이유로 친권을 주는 일이, '가정보호'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아동 성폭력도 과거엔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학교 폭력도 아이들 장난으로 치부하던 때가 있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그 변화는 우리 모두가 무심코 지나쳤던 '안방의 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김경준 사회부기자 ultrakj75@hk.co.kr
수지(가명)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긴장하던 첫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복받친 감정을 쏟아냈다. 거친 욕설을 재연하다 이내 한숨을 지었다. 그의 표정과 눈빛, 만지작거리는 손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다. 분노와 공포, 슬픔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한국일보가 25~29일 연재한 '안방의 비명' 기획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만난 수지씨는 25년간의 학대 끝에 아버지를 살해한 어머니의 비극을 1시간 넘도록 풀어놨다. 상담사, 경찰, 변호사에게 열 번, 스무 번 했을 얘기였지만 그의 감정은 무뎌지지 않았다.
나에겐 이렇다 할 폭력의 기억이 없다. 취재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가정폭력은 나와는 상관 없는, 대수롭지 않은 '남의 일'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곧 깨달을 수 있었다. 수지씨의 감정이 전이되면서 숨이 막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빠 없는 지금에서야 엄마와 함께 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수지씨의 말에서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 돼서야 지긋지긋한 공포에서 벗어나 편안해지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국가가, 법과 제도가, 우리 모두가 이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의 학대 상처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어른들,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가해남편에게 확인해서 그냥 돌아가는 경찰, 가정을 지켜야 한다며 가해자를 격리하지도 엄벌하지도 않는 가정폭력특례법이 피해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
이런 식이다. 폭력 남편에게서 도망쳐 아이와 함께 가난하지만 단란한 삶을 살고 있던 여성은 남편에게서 온 전화 한 통 때문에 공포에 휩싸인다. 저소득층에 학용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별 생각 없이 남편에게 연락했다가 아이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준 탓이다. 아버지가 친권자라는 이유지만, 이 때문에 단란했던 가정은 한 순간에 위험에 빠졌다. 취재 과정에서 이런 사례들을 만나면서 부모라는 이유로 친권을 주는 일이, '가정보호'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아동 성폭력도 과거엔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학교 폭력도 아이들 장난으로 치부하던 때가 있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그 변화는 우리 모두가 무심코 지나쳤던 '안방의 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김경준 사회부기자 ultrakj75@hk.co.kr